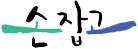[시론] 문재인 대통령의 5년 전 약속 / 윤지영
윤지영 변호사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27699.html#csidx86645b7fe0ff9df86518f4fb77b98b0 
 |
윤지영 ㅣ <손잡고> 변호사
내가 활동하는 ‘손잡고’라는 단체에는 아주 유명한 분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노동자들을 옥죄는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가압류를 손에 손잡고 막아보자며 2014년 ‘손잡고’라는 단체가 만들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손잡고’에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조국 전 민정수석이 ‘손잡고’의 공동대표를 맡았다. 이후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시절 남긴 축사가 동영상으로도 남아 있다. 다시 봐도 명언이다.
“손해배상과 가압류의 남용은 노동3권을 무력화시키는 부당한 처사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고달픈 싸움에서 승리하고도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세상을 떠난 분도 여럿입니다. 수십억에 달하는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감당하지 못해 가족을 잃기도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시민들의 맞잡은 손을 이어받아 노조법 개정안 노란봉투법을 관철시켜낼 것입니다. 반드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자들의 삶을 지켜내겠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 그래서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 우리 손으로 만들어나갑시다.”
하나도 틀린 말이 없다.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가압류 결정이 노동자들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노동조합을 얼마나 무력하게 만드는지 소송을 해본 사람은 안다. 당사자의 고통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한때 그도 노동자들의 변호사였으니 그러한 상황을 모를 리 없을 것이다.
노동자들에 대한 손배·가압류에는 몇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손해를 보전받는 게 목적이 아니다. 일반적인 손배소송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전받기 위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노동자들을 겨냥한 손배·가압류는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의 손발을 묶는 게 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액수도 터무니없다. 아사히글라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5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장 앞 도로에 ‘해고자 복직’ 등 문구를 래커로 썼다는 게 이유였다. 인지대가 부담될 게 없는 기업은 이런 식으로 액수를 부풀려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부르는 게 값이다. 둘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희석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게 손배·가압류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은 한국지엠(GM)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장 안에 못 들어오게 공장 대문에 쇠꼬챙이를 박았다. 그러고는 십수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국도로공사는 비정규직 요금 수납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은 무시하면서도 동시에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법원에 기댔다. 가해자인 기업이 스스로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데에 손배·가압류만한 것도 없다. 셋째, 손배·가압류로 노동자들의 삶은 파괴된다. 파업을 강행하는 순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계약 갱신 거절이라는 이름의 해고 폭탄, 그리고 손배·가압류 폭탄을 맞게 된다. 해고된 것도 모자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경제적으로 족쇄를 찬 상황에서 대형 로펌을 앞세운 기업을 상대로 몇년을 싸워야 한다. 이긴다는 보장은 없다. 그간의 법원 판결을 돌이켜 보면 백전백패다. 불법으로 낙인찍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다지 많지 않다. 손배·가압류 때문에 죽음을 택한 노동자들도 여럿이다. 결국 소 취하와 가압류 해제로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당한 요구도 포기하게 된다.
대통령의 약속을 믿었던 게 잘못일까. 대통령 취임 초기, 약속을 어떻게 지킬지 청와대에 물었지만 아직까지 답을 듣지 못했다. 여당 의원을 통해 법 개정안도 발의했지만 그것으로 끝이었다. 조만간 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될 것이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는다. 손배·가압류가 노동자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더욱 가혹하다는 것을 대통령도 정녕 알고 있다면, 그럼에도 묵인하고 있는 것이라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일하다 죽은, 차별받다 죽은 이의 이름으로 말하고, 들어달라 소리치고 끝내 다시 살아 나서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