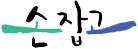ㆍ(4) 손배·가압류 ‘공포’
강진구 노동전문기자(공인노무사)·박철응 기자 kangjk@kyunghyang.com
양형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정책실장(51)은 2010년 7개월의 옥살이를 마치고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 회사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때문이었다. 20여년간 일한 퇴직금은 모두 가압류돼 영수증만 손에 쥐었다. 형벌로 해고돼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됐고, 설상가상으로 살고 있던 아파트도 압류돼 경매로 넘어갔다.
취업을 하려 해도 ‘쌍용차에서 밀려난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어려웠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양 실장은 “매달 월급 받아 생활하는 노동자에게 수십억원 손배를 청구해버리면 어찌 해볼 도리가 없다”면서 “아내가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쌍용차와 경찰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 공판에서 파업 노동자들에게 4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3월 복직한 무급휴직자 26명은 월급의 절반이 가압류된 채 최저임금 수준인 월 120만원가량을 받으며 근근이 살아가고 있다. 그게 끝도 아니었다. 46억원의 손해배상도 버거운데, 이번에는 보험회사가 110억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내밀었다. 2009년 파업 중에 평택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 쌍용차에 110억원을 지급한 메리츠화재가 “화재 책임이 노조에 있다”며 전액을 내놓으라고 한 것이다. 이 소송은 소장만 접수된 채 3년여간 진행되지 않다가 지난주부터 재판이 시작됐다.

▲코레일이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해 파업한 노동조합에 ‘손해배상 313억원, 가압류 116억원’을 청구해 사회문제가 된 지난 2월 노동계·학계·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손배가압류 잡는 손잡고’의 출범식을 하고 있다. ‘손잡고’는 손배·가압류 문제를 공론화하면서 ‘노란봉투’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다. | 서성일 기자
대규모 정리해고에 맞서 노동자들의 최후 권리인 파업을 벌인 대가가 노조와 개인·가정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며 벼랑으로 밀어넣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파업(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는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손배폭탄’으로 불리는 이유다. 사측으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위협이나 소송을 당한 노동자들은 “그 공포를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것”이라고 말한다.
2008년 부산 삼화여객 정비사·사무직노조 대표를 이끌며 조합원 16명과 함께 6개월간 파업투쟁을 했던 서양수씨(47)는 회사가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면서 ‘추정 손해액 15억원’이라고 주장하는 문건을 보는 순간 ‘정말 지면 다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서씨는 “회사에서 고소하고 경찰 가서 조사받아도 흔들리지 않았는데, 회사가 ‘노조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신원보증인에게도 손해배상을 물리겠다’고 통보하면서 노조가 와해됐다”고 말했다. 단지 기업들의 피해 보전 차원을 넘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얼마나 노조를 겁박하고 와해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지 몸으로 겪은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기업이 잘돼야 노동자도 산다’는 논리와 기울어진 궤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3년 1월 두산중공업에서 배달호씨 분신 사건이 일어난 후 손해배상·가압류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노동계와 시민단체 요구가 계속되고 있지만, 논의는 원점에서 맴돌고 있다. 10년간 신용보증제도를 개선하고 임금 압류 범위를 2분의 1로 제한하는 조치가 이뤄졌을 뿐이다. 그사이 쟁의행위 후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액은 2001년 200억원에서 올해 초 민주노총 17개 사업장만 해도 1691억원으로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외려 손배·가압류는 이명박 정부를 거치며 공공기관도 벤치마킹하는 ‘통치수단’으로 더 활개를 치고 있다. 법무부는 2009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공부문에서도 손해가 발생하면 민사책임을 추궁하겠다”고 선언했다. 2010년 당시 강희락 경찰청장은 “민주노총과 쌍용차 노조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냈는데 민사적 대응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점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그 흐름은 경제민주화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다. 박 대통령이 대선에서 이긴 직후인 2012년 12월21일, 한진중공업 노동자 최강서씨가 ‘태어나 듣지도 보지도 못한 돈 158억원을 철회하라’는 유서와 함께 노조 회의실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하지만 현 정부도 기업들의 무분별한 손배소송에는 ‘법과 원칙’만 앞세우며 팔짱을 끼고 있다. 지난 2월 민주노총이 공기업 민영화 반대 총파업을 예고하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에 주문한 것이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이었다. 경총은 당시 회원사 행동지침을 통해 “단순 가담자라도 맡은 역할 및 행동에 따라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며 “노조의 불법행위와 손해 발생에 대한 구체적인 채증에 신경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사용자의 손배 청구가 방어보다 공격 수단으로 변모된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실제로 과거엔 파업 후 노사 양측 합의 때 손배 청구를 취하하거나 최소한 가압류라도 풀어주는 일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엔 조합원 개개인의 재산에 건 가압류를 대법원 소송까지 유지해 노조를 압박하는 경우가 많다. 정영하 전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2012년 파업 종료 후에도 회사가 가압류를 풀지 않아 2년간 조합비 21억원이 모일 때까지 노조 통장을 사용하지 못했고, 집을 압류당한 조합원들은 지금도 집을 팔 수도 전세로 내놓을 수도 없어 이사가고 싶어도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법률원 김태욱 변호사는 “법원이 쟁의행위 정당성 요건을 협소하게 보면서 경영상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피해액을 산정하고 있다”며 “기업들로서는 노조 탄압의 손쉬운 수단으로 파업을 활용하고, 손배·가압류 청구를 통해 파업을 하면 오히려 이득을 보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7242158395&code=9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