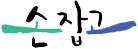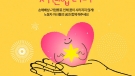노조의 파업 뒤 회사가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부당성을 논의하는 시민사회기구가 생겨난다고 한다. 이 기구를 제안한 한홍구 교수는 “법원이 쌍용차 조합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것을 보고, 헌법적 권리인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당하는 현실에 대해 지식인으로서 반성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노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이나, 본격적으로 파업에 대한 보복과 위협 수단으로 악용된 시점은 1997년 아이엠에프 사태 이후다.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총액만 지난해 말 1135억원에 이르는 등 급증 추세에 있다.
우리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정당한 파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합법적인 판결로 인정되는 범위가 너무 좁다는 것이다. 노조법은 쟁의행위를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도 주체, 목적, 절차, 수단이라는 4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법적인 파업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그러다 보니 사내하청 노조가 쟁의에 나서면 주체에서 문제가 되고, 구조조정에 반대하면 목적 때문에 정당성을 상실하고, 분쟁이 격렬해져 공장 점거가 발생하면 수단이 불법이 되고 만다. 노조가 아무리 조심스럽게 파업을 이끌어가더라도 불법의 경계선을 넘기가 너무 쉬운 것이다.
노사가 갈등을 일으킬 때 노동자들은 파업을 할 권리가 있고, 회사는 직장폐쇄로 맞설 권리가 있다. 서로가 각자의 권리를 행사하며 싸우고 협상할 수 있을 때 힘의 균형과 조화가 이뤄진다. 그런데 애초 운동장 자체가 기울어지다 보면 회사 쪽은 파업에 성실히 응할 생각이 나지 않고, 노조는 더 과격한 수단에 끌리게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뿐이다.
현재 영국은 조합원 수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 가액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고, 프랑스는 통상적인 파업권의 행사가 아닌 폭행·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배상만 인과관계를 엄격히 따져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국회에도 관련 법률의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심상정 의원이 낸 개정안의 경우 영업손실 등 단순한 노무제공 거부로 인한 손해 배상을 제한하고 폭력 등으로 직접 피해가 발생한 부분만 책임을 묻자는 취지다. 국회가 제 일을 하지 않으니 시민사회가 먼저 나서고 있는 것이다. 늦었지만 2월 국회에서라도 성실하게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