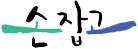'파업전야', '그림자들의 섬' 지나왔지만... 참혹한 현실
[리뷰] 영화 <파업전야>와 <그림자들의 섬>, 그리고 지금
원문보기 http://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2493903...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열리는 서울독립영화제 일정 중 특별한 상영이 있었다. 지난 5일 오래된 필름영화를 디지털로 복원해 보존 및 상영하는 아카이브전에서 1990년 제작된 <파업전야>를 상영했다.
노조를 결성하고 파업을 조직하는 노동자들의 갈등과 고민, 각성을 그린 영화 <파업전야>는 당시 노태우 정부의 탄압으로 '상영하고 보는 것 자체가 투쟁'이었다.
상영을 한 이후에는 필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얼른 들고 도망을 가는 식으로 상영을 전전했던 영화와 제작자들이 거의 30년이 지난 멀티플렉스 대형 극장에서 관객과의 대화까지 진행했으니, 감개무량할 만도 하다.
관객과의 대화에 참여한 <파업전야>의 한 제작진은 "이 영화가 화석화 되길 바랐다"고 말했다. 하지만 극장을 메운 관객의 상당수는 이 영화를 처음 보는 젊은층이었다. 전설적인 영화를 직접 보고싶다는 열망도 있었겠지만 한 젊은 관객은 이 영화를 보고 "그땐 그랬지가 아니라 현재로서 느꼈다"고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영화 상영의 자유가 발전하고 노동환경과 노동운동도 그때보다는 나아졌다고 해도 과연 우리 사회가 <파업전야>에서 노동자들이 부르짖은 '노동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에는 쉽게 그렇다고 대답하기 어렵다.
<파업전야>가 사실주의적인 픽션이라면 다큐멘터리 <그림자들의 섬>(2013)은 파업전야의 시대부터 현재까지 노동운동을 논픽션으로 증언한다. 늘 리얼리즘은 리얼리티를 따라갈 수가 없는 법, 즉 현실은 사실주의적 픽션을 언제나 능가한다.
<파업전야>에서 마지막에 각성하고 스패너를 치켜올린 노동자들이 이후 노조를 조직하고, 파업을 하고, 열사투쟁을 하고, 고공농성과 사회적 연대를 하는 30년 간의 이야기가 <그림자들의 섬>에서 한진중공업 노조를 배경으로 펼쳐진다.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뿔뿔이 흩어져있던 노동자들이 각성하고 단결하며 끝나는 엔딩은 낭만적이다. 하지만 낭만 이후 현실은 지속되고 노조에 대한 탄압도 노동운동과 함께 변화, 발전해 간다.
<그림자들의 섬>에서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은 1990년 노조위원장을 의문사로 잃고 시신마저 탈취 당한다. 이후 노조탄압에 맞서 크레인 위 고공농성을 하던 노조위원장을 또 잃고, 함께 괴로워하던 동료마저 잃는다. 그리고 회사의 손배가압류는 또 다른 동료 열사를 만들어내고 말았다.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동료를 열사로 잃고, 노조 동지들을 잃었다가 얻고, 얻었다가 잃었다. 노동운동의 역사는 한편으로 노조탄압의 역사이기도 했고, 또 노동자들이 사람답게 살고 회사와 사회의 주인답게 되어가는 끝나지 않는 싸움의 역사이기도 하다.
지금도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으로 과로사하고, 사람이 우선되지 않는 작업환경 속에서 목숨을 잃고, 회사가 고용한 용역에게 폭력을 당하고, 손배가압류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회사는 노동운동을 하다가 열사가 된 가족을 회유하고 입막음 한다.
그럼에도 늘 회사가 아닌 노동자들에게 '양보의 미덕'을 요구하고 노동자들의 권리가 법제도로 한 보 나아가면 기업과 재벌을 위한 배려는 두세 보 나아간다. 10%대의 OECD 최하위 노조조직률의 나라에서 '귀족노조가 나라를 망친다'느니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는 말이 통용된다. 여전히 노동자들은 '그림자'로서 '파업전야'에 살고 있는 것이다.
서울독립영화제 <파업전야> 관객과의 대화에서 또다른 제작진은 "<파업전야>의 지금 재상영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라는 관객의 질문에 "과거의 영화가 현재 관객에게 외면을 받는다면 그것이 화석화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에 봤을 때도 여전히 반향과 감동을 주고 관객에게 받아들여진다면 의미가 있다"고 대답했다.
어쩌면 지금의 노동현실이 30년 전의 빛바랜 노동영화를 현재로 다시 불러낸 것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