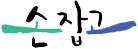원문보기 :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36
- 윤지선 (‘손잡고’ 활동가)
“가임기 여성은 다 잘라야 해.” 이 한마디가 두 노동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2015년 한 종교단체 관련 사회복지관에서 일하던 ㄱ씨는 당시 상사에게 둘째 임신 소식을 알린 터였다. ㄱ씨의 면접관이기도 했던 상사는 “면접 때는 둘째 안 낳는다고 했었다”라며 ㄱ씨를 뻔뻔한 사람이라고 했다. 해당 발언을 전해들은 ㄱ씨는 고민 끝에 상사와 복지관 관장에게 시정을 요구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문제 제기가 직장 내 왕따, 해고, 손해배상 소송 등 민형사 소송으로 이어질 거라고는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다. 동료들은 ㄱ씨와 상사의 갈등이 깊어지자 하나둘 등을 돌렸다. ㄱ씨가 조직 문화를 흩트리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동료들 대부분이 등을 돌린 자리에 남은 한 사람이 있었다. 비정규직 노동자 ㄴ씨였다. 복지관의 프로젝트 사업을 위해 채용된 ㄴ씨는 ㄱ씨의 편에 선 뒤 정규직 동료들한테 ‘이기적인 ㄱ 때문에 괜한 피해 보지 말라’는 조언을 들었다. ㄴ씨는 ㄱ씨를 혼자 둘 수 없었다. ㄱ씨에 대한 복지관의 태도가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벌어진 괴롭힘’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기 때문이다. ㄱ씨가 임신했다는 이유로 차별받는다면 그건 ‘일자리 성차별’ 문제라고 목소리를 냈다.
피해자와 연대한 계약직 노동자의 ‘최후’
계약직이 피해자에게 연대한 대가는 가혹했다. ㄴ씨는 프로젝트 사업이 끝나기 전 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 해지됐고, 4년이 지난 지금도 5건의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려 재판을 받고 있다. 계약 해지된 사람이 복지관 일을 외부에 공론화하고, 대책위를 꾸리고, 1인 시위를 하고, 기자회견을 했다는 이유였다. 자신의 주장과 관련 행동을 개인 페이스북에 올린 것까지도 해당 복지기관 법인과 관장은 용납하지 않았다. 페이스북 게시글은 하나당 100만원이 책정됐다. ㄴ씨는 얼마 전 복지관으로부터 누적 금액 22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 서면을 받았다.
유일한 자기편인 ㄴ씨가 쫓겨난 후, ㄱ씨에게는 출산 후 복귀한 직장이 지옥 같았다. 가해 당사자인 상사와 한 공간에 배치되어야 했다. ㄴ씨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회의 과정 역시 지켜봐야 했다. 스트레스로 인해 직장에서 쓰러지는 일도 있었다. 산재 신청을 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복지관은 자신들의 괴롭힘을 인정하는 대신 ㄱ씨가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평생 사회복지사 외에 다른 직업을 갖지 않았던 ㄱ씨는 해고를 당한 후 살던 지역에서도 이사해야 했다. 둘째를 임신하기 전까지 ㄱ씨는 직장에서 별다른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다. 복지관은 조직 내 위계가 분명했고 시키면 해야 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육아휴직 중에도 상사가 개인적인 일로 부르곤 했다. 물론 그렇게 한 일은 모두 무급이었다. 복지관 고액후원자 접대 자리에 부르면 거절하지 못했다. ㄱ씨에게 복지관은 무엇을 요구하든지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곳이었다.
지난 7월16일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마음에 안 드는 직원을 왕따시키고, 언어폭력을 일삼고, 상사가 개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직장 갑질’을 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얼마 전 ㄱ씨와 ㄴ씨를 만난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이 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이 법이 몇 년만 더 빨리 시행됐다면, 저는 지금 사회복지사 일을 그만두지 않아도 되었을까요?” 위로밖에는 돌려줄 수 있는 대답이 없었다. 안타깝게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